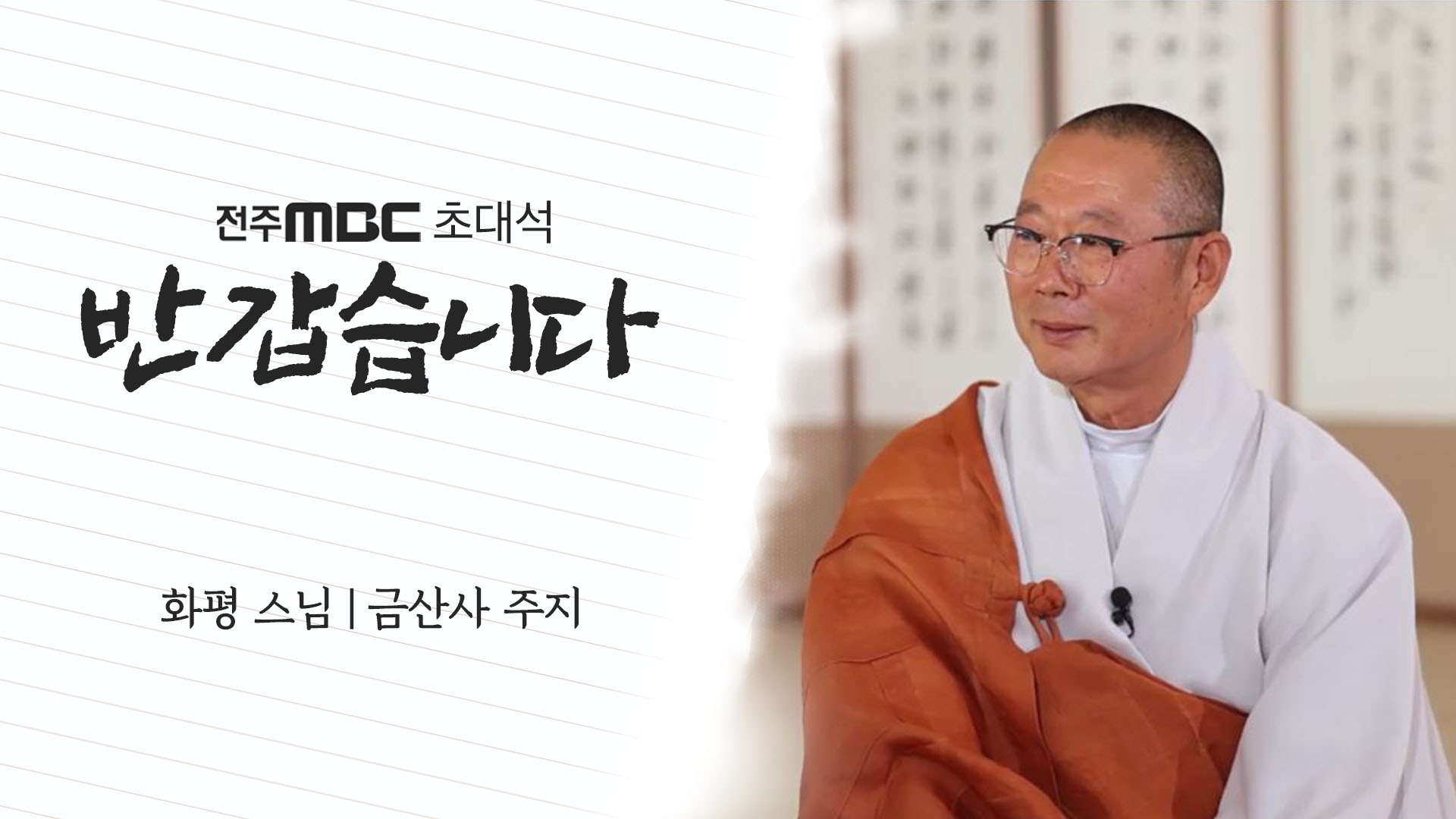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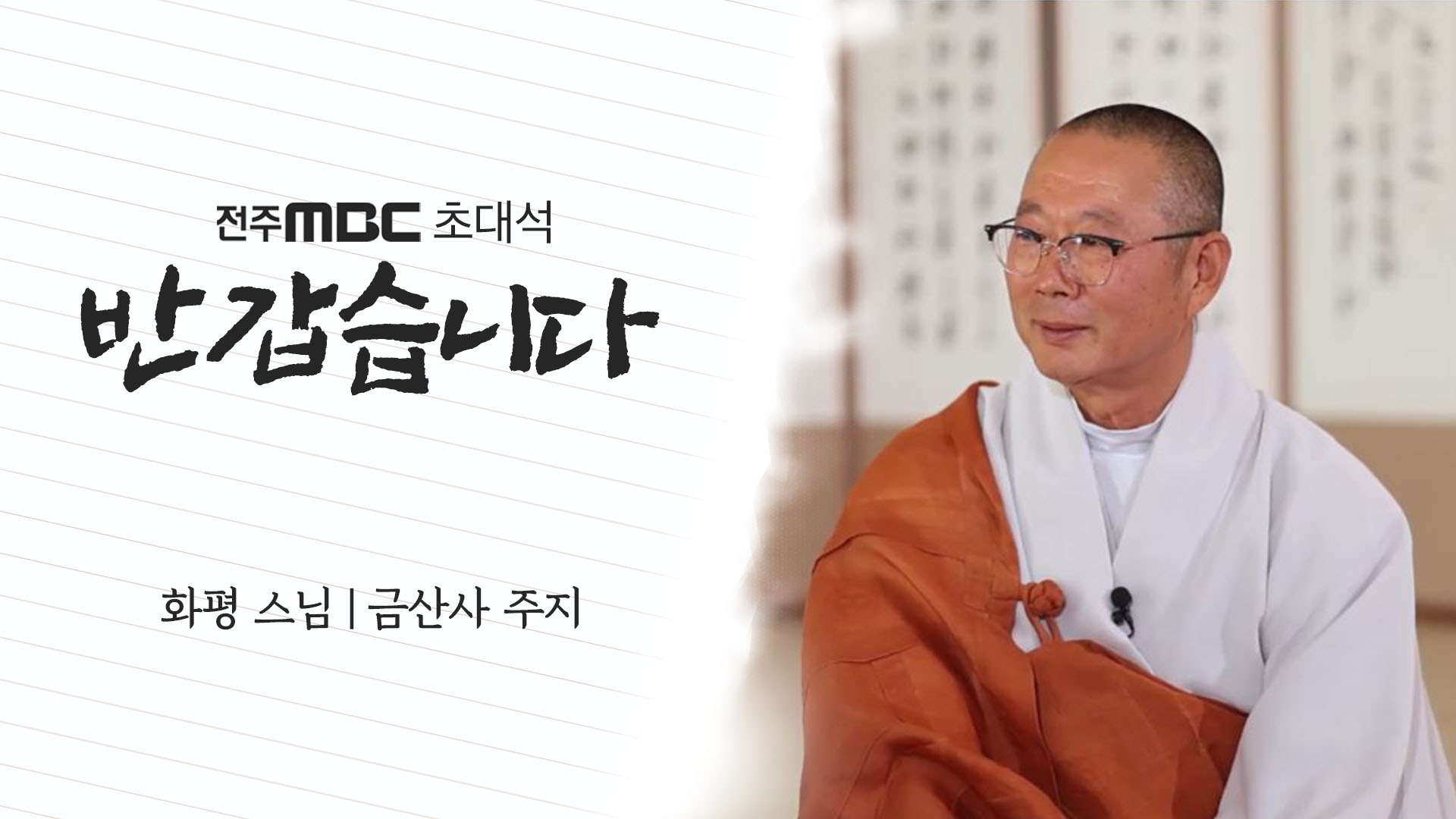
개성이 돋보이는 창법을 구사하고, 스타로서의 '끼'를 마음껏 펼치는 장!
슈퍼스타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매번 화제인데요.
만약, 조선시대에 슈퍼스타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1813년 판소리 서바이벌 경연이 한양에서 펼쳐졌다면? 그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흥부를 질투한 놀부가 제비를 후리러 가는 대목을 자신의 스타일로 창작한 조선시대 판소리 명창, 비가비 권삼득이 최고의 슈퍼스타로 꼽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 3! 오늘은 조선시대 슈퍼스타 소리꾼, ‘비가비 권삼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충훈 아나운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3!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 센터, 서정화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화]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 센터장 서정화입니다. 인문 클래스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인문클래스 시즌 3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무리를 잘했으면 합니다.
[진행자]
센터장님께서 인문 클래스 시즌3까지 잘 이끌어 주셨는데요. 시즌 3를 마무리하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정화]
작년에 제가 인문 클래스에서 “길 따라 이름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콩쥐팥쥐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우리 지역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진행자]
길 따라 이름 따라 도로명 주소로 풀어보는 우리 지역 이야기, 오늘은 어떤 길을 따라가 볼까요?
[서정화]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주 MBC의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진행자]
완산구 선너머1길 50입니다.
[서정화]
그러면 선너머1길의 “선너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행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 넘지 마라” 할 때의 선너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원 너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화]
맞습니다. 예전에 전주MBC 근처에 화산서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구도심에서 보면 다가교를 건너 예수병원을 넘어서 화산서원이 있었습니다. 전주MBC는 화산서원 너머에 위치합니다. 화산“서원 너머”에서 “선너머”라는 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선 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주MBC의 행정동이 중화산동이잖아요. 여기서 중화산동이 화산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산동과 화산동이 있었어요. 1973년에 합쳐져서 중화산동이 되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선너머 길 이야기인가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거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서정화]
오늘 살펴볼 도로명은 “권삼득로”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선너머”로 뜸을 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문 클래스 시즌 3 제1~제10강을 왕기석 명창이 진행하셨습니다. 수미쌍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제20강에서 국악인을 다루는 것은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리는 당연히 못 하고, 귀명창도 안 되고, 말 그대로 국악의 문외한 중의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삼득 명창을 주제로 잡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삼득로를 주제를 정했다는 건, 이 길을 따라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거겠죠?
[서정화]
맞습니다. 사실 제가 “권삼득”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전주역을 오갈 때 전북대 정문 앞에서 신호에 걸립니다. 이때 좌우로 살펴보면 “권삼득로”라는 도로명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고전을 전공하기 때문에 정여립로의 정여립(鄭汝立), 충경로의 이정란(李廷鸞), 추탄로의 이경동(李瓊仝), 황강서원로의 이문정(李文挺), 이분들은 들어봤는데 권삼득이라는 분은 처음 접했거든요. 제가 출신이 경상도인지라 국악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판소리계의 엄청난 거물급 인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주시의 주축인 도로 2개가 있잖아요?
[진행자]
기린대로와 백제대로죠.
[서정화]
잘 알고 계시네요. 권삼득로는 기린대로와 나란히 갑니다. 전주시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린대로의 시작은 대형마트와 전주고등학교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참고로 전주고등학교의 주소가 권삼득로 2입니다. 전주고등학교를 출발해서 금암초등학교를 지나, 전북대학교 정문,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 덕진공원,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그리고 큰길을 지나서 전북특별자치도문학관, 전주천변까지 대략 4.6km 정도입니다.
[진행자]
전주천을 끼고 있는 호반촌에서 시작해 전북대를 지나 시내는 관통하는 전주고등학교까지 이르는 길 이름이 권삼득로이군요.
[서정화]
그렇습니다. 이 길을 권삼득로로 명명한 것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과 관련이 많습니다. 도립국악원 주소가 권삼득로 400인데, 도립국악원 앞마당에 ‘국창 권삼득 기적비(國唱 權三得紀蹟碑)’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비문에는 권삼득의 이력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권삼득로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삼득” 하면 주로 “비가비 권삼득”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권삼득 앞에 붙은 비가비는 어떤 뜻인가요?
[서정화]
일반적으로 판소리는 천민인 광대, 그러니까 흔히 사당패에 속한 광대들이 불렀는데, 18세기 중후반에 오면 양반이나 중인 신분으로 판소리에 능한 광대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민 출신 광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양반이나 중인 출신의 소리 광대를 비가비라고 했습니다. 비가비는 비갑(非甲)이, 비갭이, 양반광대(兩班廣大)로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비가비로 최선달(崔先達), 권삼득(權三得), 정춘풍(鄭春風) 등이 있습니다.
[서정화]
비가비의 어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당패, 요즘은 유랑연예집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우두머리를 모가비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아무개 모(某) 자에 으뜸 갑(甲) 자, 모갑(某甲)이 됩니다. 그런데 양반이나 중인은 사당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다 아닐 비(非) 자를 붙여서 ‘비모갑(某甲)이’라 했고, 여기에서 모 자를 떼고 ‘비갑(甲)이’ ‘비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가비 권삼득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권삼득은 어떤 분인가요?
[서정화]
권삼득은 양반 출신이어서 다행스럽게도 생몰년과 가계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권삼득은 1771년(영조47)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에서 태어나 1841년(헌종7) 5월 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안동 권씨이고, 추밀공파 28세손 권내언(權來彦)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政)이고, 자는 사인(士仁)이며, 호가 삼득(三得)입니다. ‘가중호걸(歌中豪傑)’이라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득’이라는 호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득은 호라고 보는데, 삼득의 의미가 석 삼(三) 자에 얻을 득(得) 자 라고 해서 사람, 새, 짐승 3가지 소리를 모두 얻었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의 소리를 모두 얻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 권내언이 아들을 부를 때 삼득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의 호를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이 삼득이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양반 출신인 권삼득이 천민이나 하는 음악을 했으니 당시 수난이 만만치 않았겠다 싶은데요.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서정화]
영웅이 탄생하려면 늘 고난이 따르는 법이지요. 권삼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고, 특히 부친의 반대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권삼득의 부친 권내언의 호가 "이우당(二憂堂遺稿集)"입니다. 이우당은 두 이(二), 근심 우(憂) 그러니까 “두 가지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근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권내언이 강필성(姜必成)이란 분에게 얘기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강필성, 근제이우당서후(謹題二憂堂序後)]
(권삼득이 말하기를……) 점을 치니 선친의 묘소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장을 시도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날마다 지관들과 산과 물을 두루 다니며 험하고 위험한 곳을 찾아가고 지세와 혈맥을 탐색하느라 몸과 마음을 모두 쏟았습니다. 그러나 지관들의 말이 앞뒤로 다르고 땅의 길흉이 서로 달라서 이장을 마치지 못했으니, 이것이 첫 번째 근심입니다. 저의 둘째 아들 삼득이가 나를 배반하고 노래와 술에 빠진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방탕한 사람들과 노닐며 집을 떠나 외지에 있는데 밤낮으로 고향을 깡그리 잊고서 집안에 무한한 욕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막을 수 없어 끝내 얼굴조차 못 보니, 이것이 두 번째 근심입니다.
[서정화]
이 말을 보면 권삼득은 아버지의 두 가지 근심 중,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불효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술과 노래 특히 노래에 빠졌고, 가출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천한 광대 짓을 해서 집안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양반집 자제가 천민이나 하는 판소리에 빠져 있으니, 당시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권삼득은 신분, 체면 그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판소리를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모르는 일이죠. 권삼득은 나중에 노래 실력 하나로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호조 참판 벼슬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지금으로 따지면 문화부 차관을 하신 거네요. 판소리에 빠진 권삼득, 그렇다면 권삼득의 판소리와 관련된 전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정화]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를 보면 신비한 얘기들이 많지요. 권삼득도 신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묏자리설입니다. 구억 마을 위에 용바위가 있는데, 날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풍수로 보면 양 날개 사이의 혈이 바로 매미혈입니다. 매미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조상의 묘를 여기에 써서 권삼득이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련과 관련된 전설입니다. 흔히 득음하기 위해서 폭포 뒤에서 수련하고 피도 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기석 명창 말씀으로는 피를 토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성대결절을 과장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수련했다는 것이겠지요. 권삼득도 소양에 있는 위봉폭포에서 수련했다고 합니다. 용진읍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 아마도 사실일 듯합니다. 그리고 권삼득 묘소 아래에 보면 “소리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보면 그다지 깊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조상의 묘를 쓴 곳이 매미혈이라고 했는데, 이 굴은 매미의 입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피우면 이 산 정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하며, 이곳에서 소리 공부를 하면 명창의 정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권삼득이 생전에 이 소리굴에서 수련해서 명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역시 소리를 터득하는 과정도 특별하군요. 그럼, 권삼득의 소리와 관련된 실화나 일화도 전해집니까?
[서정화]
소리와 관련된 일화가 많을 텐데, 그중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일화 하나를 보겠습니다.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조선창극사 中]
① 권삼득이 소리 공부에 전념하자, 가문의 치욕이라 여긴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
② 권삼득이 죽기 전에 소리 한번 하기를 원하자 허락하였다.
③ 거적 밑에서 비절창절,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
④ 이에 가족들은 죽음을 면하게 하고 족보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다.
[서정화]
이 일화는 권삼득이라는 개인의 희망과 안동 권씨 곧 양반 가문의 명분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반 자제가 천민이나 하는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권삼득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를 벗어날 정도로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권삼득의 판소리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서정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평가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있는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창극사 中]
곡조(曲調)가 단순(單純)하고 그 제작(製作)이 그리 출중(出衆)한 것이 없으나 세마치장단으로 일호차착(一毫差錯)이 없이 소리 한바탕을 마치는 것이 타인(他人)의 미치지 못할 점(點)일뿐더러 그 천품(天稟)의 절등(絶等)한 고은 목청은 듣는 사람의 정신(精神)을 혼도(昏倒)케 하였다 한다.
[서정화]
“곡조가 단순하고 제작이 출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비가비 출신이라서 기량에 한계가 있다는 말인 듯합니다. 정노식 선생이 한 세대 후배인 송흥록에게는 “변화무쌍하다”고 평가했는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판소리에 입문이 늦어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수련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러나 장단에 어긋남이 없이 사설을 짜나가는 솜씨가 경지에 이르렀고, 특히 타고난 목소리가 고와서 사람들을 기절시켰다고 하니, 권삼득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진행자]
그러면 교수님, 권삼득 창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서정화]
권삼득의 씩씩하고 경쾌한 창법은 권마성(勸馬聲)에서 왔습니다. 권마성은 말잡이에게 권하는 소리라는 뜻으로, 높은음을 길게 지속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가마를 수행하는 거덜이나 사령들이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높은음으로 길게 메기면 말잡이가 이를 받아 길게 소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에 쓰입니다. "흥보가" 중에서는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라는 대목을 부를 때의 창법을 ‘권마성제’라 합니다. 권마성제는 설렁제, 덜렁제라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권삼득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권삼득이 창법을 만든 창시자이고,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은 권삼득의 전매특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재효, 김창용, 이화중선 명창과 국문학자 조윤제의 증언에 의하면 권삼득의 독보적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비가”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권삼득은 비가비, 곧 양반 명창인데 권삼득 외에도 비가비 명창이 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정화]
원래는 권삼득이 최초의 비가비 명창이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권삼득의 한 세대 선배 중에 최선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해주최씨 좌랑공파 27세손인 최예운(崔禮雲)으로 밝혀짐으로써 최초의 타이틀은 빼앗겼습니다. 최예운은 명창이 되어 어전에서 소리하고 가선대부 벼슬을 받았던 최초의 비가비 광대였다고 합니다. 권삼득도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는데, 직간접적으로 최예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권삼득의 후배 비가비 명창으로는 충청도 출신의 정춘풍(鄭春風), 금구 출신의 서성관(徐成寬), 전라도 출신의 김도선(金道先), 김제 출신의 안익화(安益化)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정춘풍이 유명합니다. 그는 소과에 합격한 진사 출신으로, 독공으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론에도 능통하여 “남에 고창 신재효, 북에 정춘풍”이라는 말이 전합니다.
[진행자]
비가비 명창은 판소리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정화]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8세기 중반부터 판소리의 정체성이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이때 최예운, 권삼득 같은 비가비 명창이 등장합니다. 18세기 초중반의 판소리는 단순하고 소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양반광대가 출현하면서 사설이 다듬어지고 품위도 갖추었다고 봅니다. 비가비 광대들은 판소리 사설에 풍부한 고사성어와 한문으로 된 다양한 미사여구를 삽입시켰을 뿐 아니라 구전되던 거친 사설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에 공헌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둘째는 최예운이 가선대부(종2품)의 자급을 받고 권삼득에 호조 참판(종2품)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판소리를 잘하면 광대도 벼슬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고, 광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위도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광대가 여전히 천민이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인식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가 권삼득의 고향이라고 했는데요. 완주에는 권삼득로가 없나요?
[서정화]
역시 예리한 질문입니다. 완주군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권삼득의 묘소 옆쪽의 약 700m를 “명창권삼득길”로 2016년도에 지정하였습니다. 권삼득로보다 길이 좀 짧긴 합니다만, 대신 완주군에서는 "국창 권삼득 국악대제전"을 2000년대부터 25년째 개최하고 있고, 권삼득 묘지, 소리굴 정비, 권삼득 관련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권삼득을 기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문 클래스 시즌3, "길 따라 이름 따라" 오늘은 전주에 있는 권삼득로 따라 "비가비 권삼득"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3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 센터, 서정화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송주원 인턴